-
엄마의 암투병: 살맛, 죽을맛도 아닌 그 맛카테고리 없음 2022. 6. 3. 13:36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블로그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주신 분들, 항상 따뜻한 사랑으로 응원해준 친구들, 문자와 이멜로 격려해주신 친구들, 폐가가 되었던 이 블로그에 글을 남겨주신 정아, 옥포동 몽실언니 님, 비니네 님 감사합니다.
엄마는 계속 암투병 중이시고, 전/체/적/으/로 잘 지내고 계십니다. 꿋꿋한 엄마 덕에 저 또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몇 달 전, 엄마의 암 선고 후 블로그의 글들을 다 닫았습니다. (지금 보니 '엄마.... 저를 믿으세요'라는 진지한 글 바로 밑에 우스꽝스러운 뼈 이야기가 있네요. 급히 방을 닫다 보니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결과. ㅠ 피식 웃습니다.)
제가 티스토리 이전, 블로깅을 시작한 것은 2003-4 년부터였지만 그 이전부터 글쓰기를 통해서 삶을 기록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스려왔었는데, 엄마의 암 선고 이후에는 글쓰기 작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일단, 엄마의 암 선고 후 큰 충격이었고, 엄마가 치료를 받기 시작하시면서는--특히 초반에-- 제 머리와 마음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제 평생의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지탱해주던, 제 마음 한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던 '기쁨'이란 감정이 훅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쁨이란 감정 대신 낙담, 절망, 슬픔이라는 감정이 자리를 차지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무겁고 어두운 감정이라도 뱀처럼 구석에 똬리 틀고 있나 찾아보았지만 제 마음의 방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블로그 글쓰기는 물론이고 문자와 이메일, 카톡 등 모든 소통의 장에서 저는 조용해졌습니다.
글쓰기를 접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공부를 하고 많은 글을 읽었습니다. 엄마의 암 치료, 매일매일의 quality time 갖기, 건강한 식사 준비 등등에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도 검사 결과 몇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의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한국어로는 글을 못 쓰지만 영어로는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현재 엄마의 암투병이 일상이 되어버린 저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옛날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라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의 엄마의 유년시절, 청소년기 이야기, 피난 이야기 등등을 '엄마의 이야기'를 적어나갔습니다. 녹슨 영어로 글을 쓰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썼습니다.
60 년간 알아온 엄마이지만,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엄마에 대해 새로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외조부모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 이야기는 물론이고, 부산 피난민 시절의 이야기들은 엄마가 이름/지명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셔서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비교해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서히 '기쁨'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는 맛이 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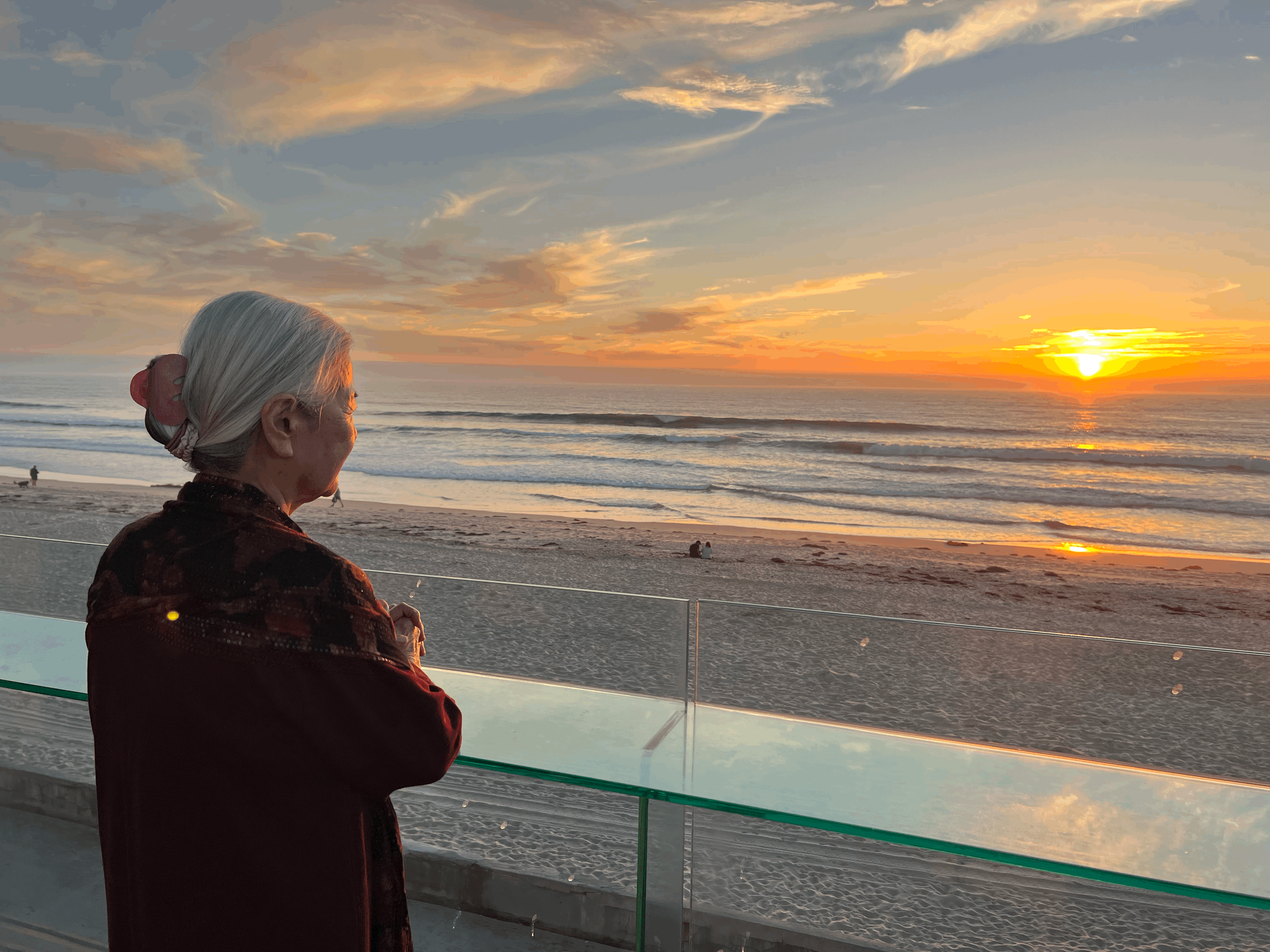
살맛? 죽을 맛?
사람들은 기쁘거나 행복한 일로 삶에 의욕이 생길 때 '살맛 난다' 라고들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로 '죽을 맛이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장성한 아이들이 집을 떠난 뒤 엄마, 남편, 저 세 사람이 단출하게 살던 집에 '암'이라는 불청객이 쳐들어와 자리를 잡은 뒤 저는 잠시--아주 잠시--살맛을 잊었고 '죽을 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암'이라는 녀석과 같이 사는 것에 익숙해져가고 있습니다. 하루 24 시간, 그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시간이 별로 없다 싶을 정도로 존재감이 강한 그 녀석 때문에 저는 죽을 맛도 아닌, 살 맛도 아닌 그런 고유한 맛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묘사해보자면....신나서 의욕이 넘쳐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암에게 압도되어 우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잔잔한 행복이라는 게 요즘 우리가 맛보고 사는 '살맛도 아니고, 죽을 맛도 아닌, 그 맛'에 가장 적절한 비유일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색깔과 맛의 행복을 누리면서 행복이란 꼭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갈 때--예를 들어 기적적으로 암이 치유될 때---만 찾아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나/름/ 살 맛 나는 삶입니다.
지금도 엄마가 기적적으로 깨끗이 치유된다면 그 무엇이라도 하겠다 싶은 간절함이 있지만, 치유가 가능하지 않다 해도 현재 느끼는 감사, 만족감, 행복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이 선택권이 없이 '엄마의 암'과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된 뒤 우리 가족이 겪은 의식의 변화때문입니다.
이제는 매사에 감사함을 느끼는 게 거의 즉각적입니다. 미래를 '끝을 모르는 시간'으로 보는 대신에 죽음이라는 '끝'을 시작점으로 보아 거꾸로 현재를 보게 된 결과입니다. 미래의 '엄마의 죽음'이라는 시점을 시작점으로 두고 거꾸로 돌이켜서 현재를 보자면 엄마와 함께하는 하루 매 시간, 매 초가 다 거저 주어진 축복임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매시간의 소중함을 의식하고 살게 됩니다. 시간이 저절로 흘러가게 두지 않고, 고삐를 잡고 같이 갑니다. 죽음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엄마가 평생 해온 평범한 일들을 하시는데 그게 다 큰 사건이고 영원히 기록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되어버립니다. 김치를 담그시는 것도, 빵을 굽는 것도, 설거지를 하는 것도... 다 이벤트입니다. 하얀 바지, 빨간 잠바, 챙이 넓은 흰 모자를 쓰고 아침 산책을 나가시는 엄마의 모습도, 오후 내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시는 모습도 너무 소중합니다. 엄마가 떠나시면 얼마나 그리운 일상, 그리운 이미지가 될지 알기에... 그렇게 하루가 주는 소소한 행복을 잘근잘근 씹다보면 입 안에 달콤함이 가득합니다. 그게 살맛도 아닌, 죽을 맛도 아닌, 우리가 맛 보고사는 그런 삶의 맛입니다.
요즘 엄마와 저는 각자 자기 방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하루 종일 틈틈이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영정 사진 같이 고르고, 장례 절차 의논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서로서로에게 감사하고, 옛날 일 떠올리면서 배를 잡고 웃고,.... 하다 보면 하루가 지나갑니다. 짧은 하루, 소중한 시간입니다. 같이 손잡고 기도함으로써 하루를 마감하곤 하지요.
옛날 오빠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는 그 지옥 같은 슬픔의 구렁텅이를 신앙으로 이겨 나오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오빠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시지만 엄마는 항상 능동적으로 기쁨과 감사를 택함으로써 어두움을 물리쳤습니다. 엄마에게 평생 최악의 고통은 사랑하는 첫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현재 본인의 암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 듯합니다. 암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전무,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은 확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고, 여기 있으라고 하시면 있으면 있으면 되는 거지"라고 하시는 엄마의 느긋함과 담대함이 저의 마음을 물들여가고 있습니다. '나도 이담에 죽음을 맞이할 때 엄마처럼 의연할 수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어쩜 나도 그럴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제가 이층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가끔 아래층에서 엄마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엄마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같은 천국을 기리는 찬송만 부르신다면 엄마가 죽음에 관해서 생각하시는구나 할 텐데, 엄마가 부르시는 노래들은 찬송가는 물론이고 한국/외국 가곡들입니다. 선율이 아름다운 그 노래들을 듣자면 엄마의 마음이 참 즐겁고 평안하심이 느껴져서 저의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엄마가 요즘 부르시는 가곡들은 우리 삼 남매가 어렸을 때 태능의 집에서 엄마가 고된 일과를 마친 뒤에 부르시던 노래들이기도 합니다. 당신만의 세계에 푹 몰입하셔서 힘차게 노래를 부르는 엄마를 훔쳐보면서 '엄마의 눈이 참 반짝거린다, 엄마의 목소리가 곱다'라고 생각했던 어렸던 저는 이제 50 년이 지나서 다시 엄마의 노래들을 듣고 있습니다. 엄마의 노쇠한 몸은 암을 품고 있지만, 엄마의 눈은 아직도 반짝거립니다. 엄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꿈이 많은 사람입니다.
에릭도 엄마의 노랫소리가 참 듣기 좋다고 합니다. 에릭은 밤에 저와 기도할 때 종종 "어머니와 같은 분을 모시고 살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 배울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기쁨이 서서히 살아나기를 기다리기보다 기쁨을 능동적으로 택해서 사는 그런 엄마와 함께 살면서 저도 과감하게 제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삽니다. 마음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방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텅 비어있던 방에 여러 복잡한 생각과 감정들이 어질러져있는 게 보입니다. 좀 정리하고 치우고 창문을 활짝 열어야겠다 싶습니다.
저도 엄마처럼 죽음에 대한 공포는 전혀 없습니다만, 고통에 대한 걱정은 큽니다. 엄마가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 제 삶이 죽을 맛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엄마가 고통을 많이 겪지 않고 죽음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조르는 중입니다. 동시에 육체의 고통은 언제고 올지 모르나 영혼이 공포와 걱정에서 자유로운 것만해도 참 감사하다고도 기도 드립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이 순간, 많이 기쁩니다. 지난 몇 달간 기도하고 묵상하고 엄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낸 것이 지금 치유의 열매를 맺는 것 같다 싶어서 감사합니다. 가끔씩 글 올리겠습니다.